완벽주의가 나를 망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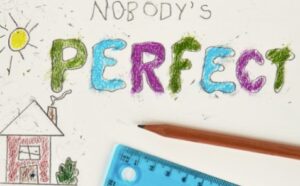
100점 아니면 0점, 그 사이는 없었다
새벽 3시, 나는 또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내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이미 여섯 번째 수정하는 중이었다. 폰트 하나, 여백 한 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었다. 완벽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완벽주의는 언뜻 보면 장점처럼 느껴진다. 책임감이 강하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며,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 실제로 나는 이런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벽주의는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옥죄고, 질식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큰 문제는 시작의 두려움이었다.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쓰는 데도 며칠이 걸렸다. 완벽한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면 키보드에 손을 대지 못했다.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완벽한 기획안이 나올 때까지 촬영을 미뤘다. 음악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완벽한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으면 악기를 만지지 않았다.
결과는 뻔했다.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세상에 나온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역설. 이것이 완벽주의자의 가장 큰 함정이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완벽주의는 사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나는 실수를 보이는 것이 두려웠다.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무능해 보이게 만들었다.
마감을 못 지키는 사람,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 완벽주의 때문에 나는 정작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이 더 필요해”라는 말은 결국 변명에 불과했다.
번아웃의 끝에서
완벽주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90점짜리 결과물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해 두 배의 시간을 투자한다. 하지만 그 10점의 차이를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나는 번아웃에 빠졌다. 모든 것이 귀찮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지쳐버린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한다. 나는 명백히 후자였다. 완벽주의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법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됐다. 한 선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완성하지 못한 완벽한 계획보다, 완성한 불완전한 결과물이 낫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천해보니 달랐다.
우선 “충분히 좋은(Good Enough)” 기준을 설정했다. 100점이 아닌 80점을 목표로 했다. 놀랍게도 80점짜리 결과물도 충분히 가치 있었다. 오히려 빠르게 완성해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었다.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됐다. 블로그 포스팅은 2시간, 영상 편집은 4시간처럼 명확한 데드라인을 정했다. 시간이 끝나면 그 상태로 발행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실수는 성장의 증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오히려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다.
유튜브에 완벽하지 않은 영상을 올렸을 때, 예상 밖의 반응을 받았다. “진솔해서 좋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멋지다”는 댓글이 달렸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진정성에 더 공감했다.
음악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완벽한 곡을 만들겠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작업했다. 오히려 그런 곡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완벽함보다 감정이 더 중요했다.
나답게 사는 것의 가치
완벽주의를 내려놓자 삶이 가벼워졌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하게 됐고, 더 많은 것을 완성했다. 실패도 했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다. 무엇보다 나답게 살 수 있게 됐다.
지금도 가끔 완벽주의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완벽함은 목표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과정이라는 것을.
당신도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완벽해지고 싶은 걸까, 아니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를 받아들이고 싶은 걸까?” 답은 생각보다 명확할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간다울 수 있다.